
오직 한 사람만의 차지 ㅡ김금희 소설
한 가지 색으로만 자수를 하는 것을 블루웍 또는 레드웍이라고 색이름을 넣어 부른다. 책의 부제를 달았다면 '오직 한 색으로만 그린 그림'이라고 지었을 것 같다. 재미는 있지만 공감하고 싶지 않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이야기의 다음이 궁금하지만 굳이 더 듣고 싶지는 않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은 무슨 색일까 싶어 색을 정하지는 못하다가 떠오른 단어가 있다. '불투명' 불투명한 창문을 통해 나를 덜 보여주는 보호색 같은 불투명함이 있고, 타인의 속 사정까지 깊게 들여다볼 용기가 없는 불투명함도 있다. 애매하게 심각하고 적당히 가벼운 삶들을 겹쳐 놓으면 그 불투명함이 또렷한 어떤 색이나 형태로 규정될 수 있을까.

읽으면서 소환된 사람들은 이렇다. 친한 친구와 닮았다며 초면인데도 친근하게 굴던 어느 희극 배우와 전원적이고 서정적인 가요를 부르는 낯빛이 유난히 하얗던 가수, 통성명은 우선 생략하고 잔을 부딪힐 때만 존재 가치를 알아주던 진지한 대화로 울상을 짓던 개그맨들, 강남 고급 진 언니들만 찾아다니던 청바지핏이 날카롭던 디지털 학원 강사,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흘려보내고 잊고 있던 이야기들을 냉동고에서 꺼냈다. 습한 상태로 보관을 잘못해서 곰팡이나 중고거래도 하지 못할 만큼 썩어버린 기억들을 누군가 꺼내 소각시켜준다면 바로 이 소설이 그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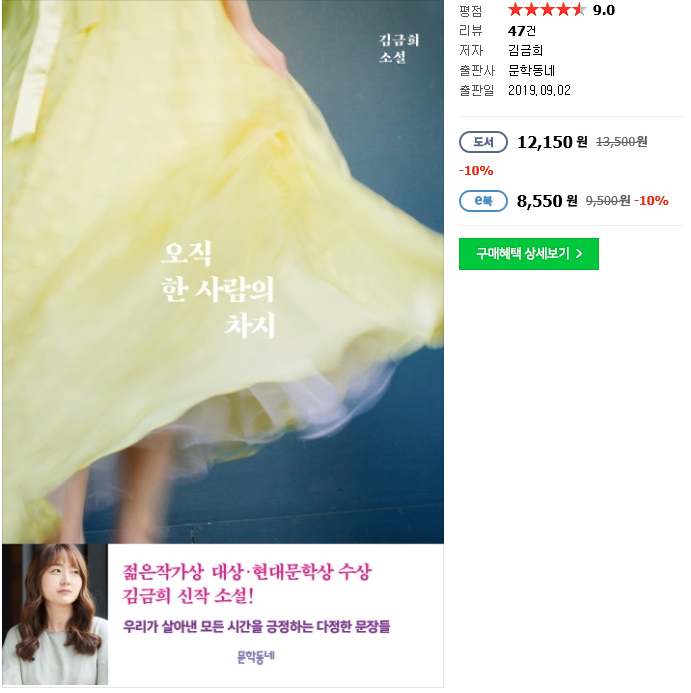
공교롭게도 대구로 문상 가는 이야기와 전염병이 돌던 시기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던 이야기는 지금 시기와 너무나 똑같아서 마치 예언자의 이야기처럼 들려 소름이 돋는다. 어딘가에라도 이렇게 박제하고 싶기도 했다.
한국 소설의 특유의 일상적인 쿰쿰함은 어디서부터 누가 시작해서 이렇게 유래되었을까. 돌아가신 할머니방이 비워진 채로 오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맡을 수 있는 메주를 띄우는 냄새 같은, 아랫목이 눌어붙어 장판 탄 냄새가 밴 아랫목, 오래전 시든 난초 화분의 마른 흙냄새처럼 어딘가 수집해두었던 기억들을 해동시킨다. 나의 나라의 언어, 한때 내 사람이었던 사람들 이야기라서 그럴까. 고양이였다면 소설 읽는 내내 골골송을 부르고 있을 것 같았다. 따뜻한 기억 같으면서도 아팠던 기억이 담겨 뼈마디가 욱신거리고 아파 자가 치유가 필요해서다. 밑도 끝도 없이 반갑다가도 슬퍼지는 추억의 아른함이란 그런 게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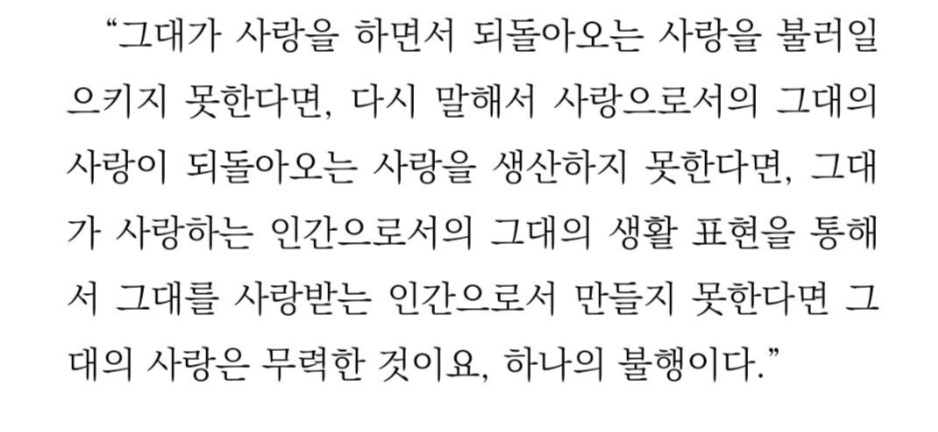
'오직 한 사람의 차지'에서 '소각'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였을까.
철이 들어야 할 나이를 한참 지났어도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반항심, 자유와 일탈을 버리지 못했으면서도 침묵하며 적당히 버티는 이중적 생활을 더는 반성하지 않는다. 어디에도 얽매지 않으리라 했으나, 정작 이불 속에 갇혀 집 안에 화초보다 더 그늘진 일상에 머물러지내는 오늘은 과연 안녕한가 하는 것이라 짐작했다.
마주 보고 사랑한다 말하면서 미래를 나눌 수 없는 연인처럼 가볍고 공허한 만남 뒤에 이별을 예감하며 쓰린 속을 달래기 위해 얼려둔 초콜릿 같은 소설이었다. 지금은 그럭저럭 버텨내지만, 미래를 장담하지 못하는 이유는 삶이 공허해서도 아니고 용기가 없어서만도 아닐 것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줄어든 상실을 고민하며 살아가기 때문 아닐까. 가장 친근했던 이야기는 편집자와 필자의 밀당이 담긴 [새 보러 간다] 였다. 밥 값, 술값 나 몰라라 갑질하는 똘아이들은 어딜가나 있으니까 말이다. 그중 가장 나쁜 갑질은 바로 의뢰인의 애매모호한 요구다. 자신에게 흔히 말하는 행복함, 부유함, 사랑스러움이라고 인생을 얼버무리는 양념 같은 것 말이다.

'TV'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집에서 혼자 운동하면 좋은 점 3가지 (0) | 2020.02.27 |
|---|---|
| [도서 리뷰] 은퇴 후 나의 40대 이야기가 될 [매우 초록] 노석미 에세이 (0) | 2020.02.26 |
| [전자책]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메뉴 52 (0) | 2020.02.25 |
| [에세이] 취미 있는 인생 (0) | 2020.02.25 |
| 빌 게이츠가 말한 인류의 가장 큰 위협 점액, 바이러스란 무엇인가 (0) | 2020.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