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를 문장 노동자라고 칭할 정도로 다독, 다작을 하는 작가 장석주 님의 산문집을 읽었습니다. 소개말을 보면 '서재와 정원 그리고 책과 도서관을 좋아하며 햇빛과 의자를, 대숲과 바람을, 고전과 음악을, 침묵과 고요를 사랑한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책과 도서관, 햇빛과 의자, 침묵과 고요 등 사랑하는 많은 부분이 교차하지만, 세대를 지나온 탓인지 또 많은 것이 다르기도 합니다.

가만히 혼자 웃고 싶은 오후 / 장석주 산문
조용한 자작나무 숲을 산책하는 듯한 피톤치드 가득한 무자극성, 무향의 풍기는 담백한 산문집을 읽었습니다. 무향도 엄연한 기능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모든 자극적인 향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읽고 있자면 고민과 통증과 불면의 밤이 고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 비염이 시작되어서 약을 먹었더니 읽어내리기가 다소 힘들어 책을 잘못 고른 게 아닐까 내심 갈등하며 읽었습니다. 다독을 한 영향으로 철학자와 작가와 고전과 다방면의 첨부 내용이 담겨있는 것은 좋은데 반복되다 보니 밋밋한 듯하지만, 종종 작가 특유의 담백함을 실어 시선을 잡아끄는 구절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기억을 잃으면 삶의 토대를 잃는다." 이 구절이 '주체성을 잃으면 삶의 토대를 잃는다'로 치환되어 들립니다. 책을 읽으면서 구절을 발췌하기보다 읽는 내내 떠오르는 영감이나 느낌을 기록하곤 합니다. 작가가 주로 어떤 기분으로, 주로 어느 시간에, 어떤 생각으로 글을 쓸까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상상하는 것이 재미있으니까요. 전 혼자 지낸 경험이 없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많지만, 오롯이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스스로를 온전히 감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혼자'라는 단어에 끌리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작가는 혼자의 시간을 많이 견뎌내온 것 같습니다. 늘 무언가, 누군가를 동경하며 그것을 기억에 보관해두었다가 산책길에 하나씩 풀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작가가 글을 쓰려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은 것 같지만, 저 스스로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더 편애하며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고집없이 담백하게 쓴 작가의 문체지만, 되려 우직한 고집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또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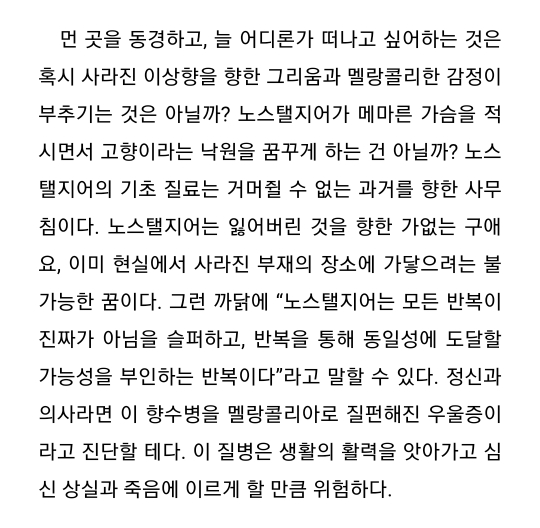
매년 많은 산문집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과연 반가운 일일까 싶기도 합니다. 문장이 아닌 감정 위주의 자극적인 산문집 일색의 서점 진열대에 순간의 허기만을 달래는 것에 실증이 느껴질 즈음 양분처럼 섭취할 양식에 가까운 책인 것 같습니다. 밋밋함과 건조함의 분위기를 풍기는 것은 비슷한데, 좋아하는 작가와 취향이 이렇게 겹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싶습니다. 하긴 책을 읽는 소수 중에서도 겹치지 않고 갈라지는 부류가 대부분이고, 책을 읽고 사는 이유도 다 제각각일테니까요. 어디든 쓰임이 있고, 읽혀질 시간대가 다른 이유로 그 많은 산문집이 나오는 이유가 되겠지요.
“우리는 시간 속을 스쳐가는 나그네들이다. 나그네들은 늘 자기가 머무는 지점에서 새출발을 한다. 그들은 과거에 구속되지 않으며 미래를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꿈꾸지도 않는다. 나그네들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에서 현재로 이동한다. 지혜로운 나그네들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근심하지 않는다. 한 끼니의 식사, 하룻밤의 잠이 보장된 것에 안심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근심이 없다.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른 채 현재 속에서 사는 자들은 행복한데, 그들은 행복에서 근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근심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198-199)
근심이 많은 밤들이 이어지면서 불행을 자처하고 있는 일상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짐작컨대 근심 없이 혼자 웃고 싶은 생각이 더 간절한 마음에 다들 그렇게 종교를 찾는 것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누가 뭐래도 요즘은 혼자를 책임지고 살아가면서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TV'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랑하는 습관 도리스 레싱 단편선 (0) | 2020.03.03 |
|---|---|
| 인생을 고르는 여자들 레슬리 피어스 스릴러 장편소설 (0) | 2020.02.29 |
| 코로나19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자기 관리 방법 (0) | 2020.02.28 |
| 코로나19에 대한 핀란드의 반응 (0) | 2020.02.27 |
| 집에서 혼자 운동하면 좋은 점 3가지 (0) | 2020.02.27 |